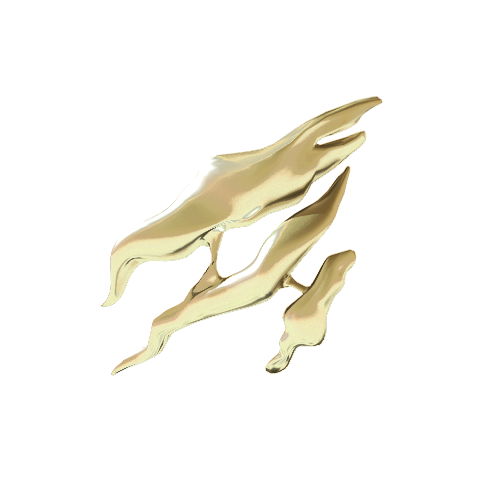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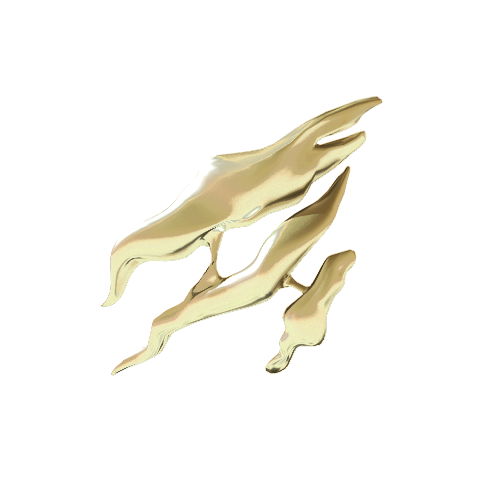
등을 진 채 감각하는 서로는, 피부로 전하는 온도와 그만큼 다른 믿음의 모습보다도
더 크고 느리게 발현되는 공통의 약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공간을 메우는 비물질이 서로의 숨과 벽을 자처하기 때문인데,
가끔은 이것이 선명히 만져진다.
ʻ크라운 샤이니스(Crown shyness)ʼ.
이 현상에는 두 이론이 양립하고 있다.
수관 끝의 부러진 잔가지들로 미루어 찰과상이 만들어낸
결과론적 형태로써 이 공간을 설명하려는 가설이 하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더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감각이
이미 그들 내부에 패턴화되어 있다는 이론이 다른 하나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스치는 수많은 사이공간들을 비집고
현상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미스터리인 동시에
증명해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현상을 먼발치에서 조감하는 시점과
숲 속에서 우러러 보는 시점을 번갈아 보았다.
현상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광각으로 찍힌 사진들에서는,
약속처럼 텅 빈 공간이 길처럼 나 있다.
전자에서는 그림자가 진 땅이,
후자에서는 시시각각의 하늘이 보인다.
무한대의 하늘땅을 그렇게 겨우 비추며 물과 햇빛만을 받아들이는 틈.
이러한 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존재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사실, shyness라면,
이 이름이 지어진 발상과 관계맺는 여러 물질적・비물질적 shyness가
인간 사회에서도 감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보임으로써 감춘 것들이 어느새 명백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은유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헤아려 보는 일은
매번 가설로부터 비롯할 뿐이다.
무언가 이야기할 때,
망설임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
아마도 당해 졸업 전시의 제목 「크라운 샤이니스」는 그 순간과 긴밀하게 관계한다.
‘크라운 샤이니스’(Crown shyness)는 한국어로 ‘수관기피현상’이다.
이는 특정 나무 위주의 숲에서 근처 나무끼리 서로의 수관을 기피하며 성장한 모습을 설명한다.
이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기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한 발 물러서서 삶과 공동체를 이어가야함을 표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와 바깥이 맞닿는 첫 지점이자 피부인 졸업 전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산림을 바라보는 이 감성적 휴머니즘의 시점을 넘어서
‘우리’ 사이에 치달은 긴장을 소통하는 것에 있다.
나무는 숲 전체의 공존을 위해 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간 성장 동세와 영역을 확인한다.
이를 지금의 상황과 견주며 하나의 장관이 만들어내는 상징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고착화한 의미를 다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인간에 비해 긴 시간이 드는 나무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한다.
수관 기피 현상은 ‘지금’에 집중해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숲 전체의 일조량을 위해 유지하는 긴장 상태는,
나무가 놓인 조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조정을 거친다.
이 긴장은
가장 앞서 언급한 어떤 머뭇거림,
또는 사츠¹와 같은 종류의 주저와 동세가 내포하는 힘이다.
크라운 샤이니스가 만들어내는 장면은, 우리 시간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겹칠까?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수림의 모습이 사실은 개별 나무의 팽팽한 긴장 속에 놓인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잔뜩 움츠리거나
서로를 우회한 채
작업을 지속한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를 뜻한다.
또는 ‘하나’를 향한 무한에 가까운 염원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계속 염원한다면 여태 이루어지지 못한 수많은 ‘하나 아님’을 함께 털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공간을 향해 모여드는 유성이 아니다.
‘하나’에서 출발해 각자의 길로 분화하는 결정(結晶)일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출발한 때와 결코 같을 수 없다.
그것은 매번 변신하며, 스스로를 유혹하고 위협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 라는 이름으로 통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를 욕망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아닐까?
사실이 이유이고 이유가 사실인 길, 하나가 욕망하는 곳,
그 자리는 이름을 통해 드러난다.
앞선 두 갈래로부터 가장 분리 가능하며, 동시에 불가능한 자리로.
크라운 샤이니스(crown shyness).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창작자들이 느끼는 ‘수줍음’이 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왕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의 창작은 ‘하나’일 수 없는 우리의 좌절과 수치심을 덮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임금님의 새 옷인 것이다.
이 옷은 언제나 거대해서 찰나에 떠오르는 좌절과 수치심을 모두 덮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안다.
게다가 어느새 그것들이 새로운 옷의 소재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성벽을 쌓고, 호수를 만들어 거리를 띄우고, 비밀은 간직한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계속되는 우리의 ‘하나’에 대한 염원은 무엇을 나누고 돕기 위함인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답이 항구적으로 미래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 미래를 현재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현실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들은 항시 자신의 영역과 서로간의 동세를 확인하며 긴장한 채 움직이고, 때로는 서로의 이름을 은유하거나 교환하면서 거듭 세계를 재구성 한다.
절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그것 자신일 수 없는 무수한 경우의 수들, 그것이 각자 가지고 있는 구체성은 세계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해영, 임재욱 씀)
1 '사츠'라는 노르웨이 언어를 연기용어로 처음 제시한 사람은 덴마크의 연출가 유제니오 바르바(Eugenio Barba)이다. 그의 책 『연극인류학』 (안치운˙이준재 역, 문학과 지성사, 2001)에 보면 사츠에 대해 "행동보다 앞서는 순간에, 필요한 모든 힘이 공간 속에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보류되어 아직 고삐가 묶여있을 때, 배우는 자기의 에너지를 사츠의 형태로, 즉 역동적인 준비의 형태로 체험한다." 라고 적혀있다. (출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연극in)